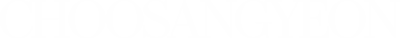움베르토 에코가 기술했던 추(醜)의 역사에서 ‘아름다움의 결핍 또는 혐오와 역겨움 등’ 처럼 미(美)에 모순되는 반(反)을 표현한 이유는 작가의 맥락적 사고에서 선택된 혐오스러움이며, 마치 마티아스 그뤼네발트의 십자가 처형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절박한 장면을 진중권은 그의 저서(서양미술사 고전예술편)를 통해 ‘저물어가는 종교의 시대가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처절한 신앙고백 일지도 모른다’고 표현했다.
작가가 경험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내면의 공황장애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연극적인 요소로 관객들 각자의 Schema를 자극한다.
고통, 공포, 처절함 등의 ‘불편한 시선’으로 표현된 작품들에서 관객은 실제로 겪어 보지 못한 경험을 거울뉴런으로 인해 작품 속의 연기자(작가)와 정서를 공유하길 바라고 있다.
작가는 “맛지마니까야 ‘천사의 경(M130)’”에서 부처님이 천사(天使: devadūta 하늘에서 온 사절)라고 표현한 보아야할 다섯 얼굴을 상기하고 있었다.
(1. 똥오줌으로 분칠하며 누워있는 갓난아이, 2. 허리가 구부러진 늙은이, 3. 병들어 괴로워하는 병자, 4. 갖가지 형벌로 고통 받는 죄수, 5. 죽어서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생겨난 죽은자)
여기서는 즐거움만 찾는 이 에게 괴로움(반(反))을 설명하며 이는 곧 자신의 얼굴임을 보라고 한다. 즉, 아름답지 않는 정(正)의 반(反)을 제시해 그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며 결국 합(合)의 katharsis를 이끌어 내게 된다.
-글 김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