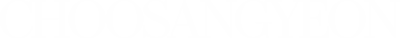Transformation

일반적으로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촬영자의 능동적 행위와, 피사체의 수동적 행위, 사물 및 대상을 보는 시각적 행위 사이에서 성립한다.우리들이 사진을 감상할 때 우선 사진의 시각정보를 취하고, 사진으로부터 표현내용을 읽어내고, 그리고 사진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사진가의 시선을 생각하게 된다. 시선은 사진가가 피사체의 인상적인 것 내에서의 표출된 내면을 포착하여 표현 의도를 전달하려한다. Self-Portrait 에서는 사진의 배후에 있어야 할 사진가의 시선이 사진 속에 리얼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통의 인물사진 에서는 사진가와 피사체의 사이에 있는 거리를 가지고, 교차하는 시선의 혼란 속에서도 일정한 각도를 유지함으로서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Self-Portrait 사진에서는 피사체가 된 사진가 본인의 눈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무한대로 진행하는 각도가 없는 직선의 시선만 존재하고 있다. 중복된 주체와 객체의 시선, 사진가 시선의 부재, 무한대로 진행하는 직선형의 피사체의 시선은 Self-Portrait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질이다.
Self-Portrait 사진의 거리의 부재성이 사진 내에서 성립하려면 사체와 피사체의 일정한 간격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나 Self-Portrait 사진 속에서는 사진가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 감각이 소실되어 있다. 존재하는 것은 카메라 뒤에 숨어 있어야 할 사체와의 거리감을 유지하지 않는 사진가 본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사진가 본인의 내면을 향한 관념적 거리로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시선의 부재, 거리의 부재는 본다, 보여진다가 일체화되면서 거울 속의 나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상연의 몸 작업은 벗어 던진 자신의 몸이 내재된 자기의 표출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의 출발로 보여 진다. 그것은 입음과 벗음, 더 나아가 외적, 내적인 것의 비교로 보았을 것이다. 알몸의 표현이 내면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음, 즉 자기란 무엇인가의 끝없는 질문을 넘지 못함의 표현이 지금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전시장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 작가 본인의 몸이라기보다는 사진속의 몸이 역(易) 거울이 되어 자신의 몸이 됨을 엿볼 수 있다. 대형 Print 작품은 Black Mirror가 되어 정체성을 잃은 현대인의 몸을 투영한 것이 분명하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스물여덟의 나이에 보통이라면, 외적인 문제를 중요시 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들이 찬사를 보내야 한다.
-사진가 이상윤